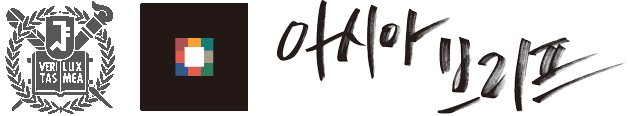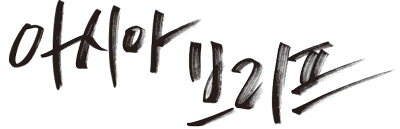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은 언론, 여론조사, 인구구성, 교육, 역사쓰기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설명이 어려운 모순적 현상도 많아서 다층적 분석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홍콩적인 것’에 대해 성찰하며, 농촌, 지역공동체, 소수집단과의 연결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
- 02-880-2087
- snuac.issuebrief@gmail.com
국가안전법 시대 ‘홍콩적인 것’의 새로운 모색


홍콩 주교산(主敎山) 지하 배수지(配水庫). 출처: 필자 제공
위 사진은 1904년 지어진 홍콩 주교산의 지하 배수지다. 수십 년 전부터 안 쓰이던 이곳을 정부가 2020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지하 배수시설을 발견했다. 홍콩에서 드문 고대 로마식 건축시설 발견에 다들 경탄했으나, 정부는 철거를 계속 추진했다. 당시 58살의 지역 주민 여성이 굴삭기 앞을 막아섰고, 그의 행동에 많은 시민이 호응하며 보존을 주장하여 결국 배수지는 1급 건축물로 지정되어 보존되었다.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최근 몇 년 사이 홍콩에서는 무언가를 ‘지켜낸다’는 것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실천하고 있다. 2006-7년 스타페리 부두와 퀸즈피어 철거 때도, 2010-2011년 홍콩 북부 신계지역 농촌마을들 철거 때도 많은 시민과 촌민이 몸으로 막았지만 철거는 강행되었다. 2014년 우산운동, 2019년 송환법반대시위에 이르기까지 홍콩에서 대부분의 사회운동이나 보존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들은 계속 다른 형태와 새로운 의미로 출현하고 있다. 2020년, 홀로 굴삭기를 몸으로 막은 평범한 주민은 백여 년 역사의 건축을 지켜냈다.
모순적 통계, 설명이 어려운 현상들
최근 홍콩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2020년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도입 후 모두가 조심스러워졌고, 언론매체가 계속 문을 닫아 언론 보도로도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론조사도 종종 서로 모순된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이 어려운 통계도 많다. 2024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여론조사에서 홍콩 언론에 대한 홍콩인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홍콩 언론의 자유에 대한 홍콩 언론인들의 2023년 평가에서는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홍콩의 자유・평등・법치 등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시위가 한창이던 2019-2020년 크게 낮아졌다가 2023년 높아졌지만, 2024년 하반기에 나온 통계는 1997년 반환 전과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낮은 평가였다.
33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 여론조사기관 홍콩민의연구소(PORI, 홍콩대 내에서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독립운영) 대표 로버트 정(鍾庭耀)이 올해 국가안전처에 두 차례 끌려가 조사받은 후, 연구소는 모든 여론조사를 중단한다고 최근 선포했다. 그 전에도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여론’은 여론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법 도입 후 커진 자기검열 분위기, 여론조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의 냉소와 무력감, 그리고 인구구성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더구나 대표적 여론조사기구조차 운영을 멈춘 상황에서, 홍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합적 측면에 대한 세밀한 관찰, 특히 밑으로부터의 관찰과 장기적・다층적 분석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안전법과 23조, 확대되는 레드라인
홍콩의 주요 언론매체 중 하나였던 입장신문(立場新聞, Stand News)은 기사 중 일부 정부 비판 기사로 인해 선동 간행물 발포(發布) 공모죄로 기소되고 2024년 9월 총편집장 등 두 명이 유죄판결 받아, 반환 후 첫 홍콩 언론매체의 ‘선동죄’가 성립되었다. 이 판결은 여러 면에서 우려를 야기했는데, 판사는 예전 판결에선 ‘선동’에서 ‘의도’가 핵심 조건이었지만 이젠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만으로도 죄가 인정된다며 죄 판정기준의 변화를 시인했다. 또 2020년의 국가안전법을 보완하고 일부 규정을 강화하고자 2024년 도입된 23조(국가안전수호조례)에 따라, 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넓어졌다.
주목받은 또 다른 판결은 47명의 민주파 입법회 예비선거 참여자들이 국가전복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국가안전법 이전에 한 행위는 원래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법정에서 평가할 땐 이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안전법에서 일부 안건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검사권을 행사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했다. 홍콩인이 아닌 사람이 해외에서 하는 행위도 이러한 법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23조의 특징은, 홍콩 행정수반(행정장관)이 국가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언제든지 추가로 부속 법규를 제정하고 즉시 발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추가로 법규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들이 급격한 질적 변화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환 전 식민시기 홍콩이 ‘민주’와 ‘자유’를 누렸던 것은 아니다. 입장신문에 적용된 선동죄도 식민시기 도입되었다. 식민시기 정치적 공간의 점진적 확대는 항상 지정학적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졌다. 반환 때 중국이 약속한 ‘50년 불변’이 깨진 게 문제라기보다, 애초에 한 사회를 50년간 동결시켜 ‘불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다는 모두의 믿음과 가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었다. 국가안전법 도입 후 연이은 언론매체와 단체들의 해산 속에서, 31년 전통을 가진 대표적 야당인 홍콩 민주당도 최근 해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보통선거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몇 년 전부터 홍콩에서는 기존 정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통선거만이 아니라 민주(民主)에 대해 훨씬 다양한 상상력과 토론이 있었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경제 침체: 오래된 문제와 새로운 문제
2025년 2월 홍콩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적자가 872억 홍콩달러라고 발표했다. 홍콩 안팎의 전문가들은 홍콩 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친정부파 정치인이나 고위 관원 출신들도 연이어 쓴소리를 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조치들은 홍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보다 홍콩인들이 중국 본토에 가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경제의 문제는 정치와 직결된 고질적 문제로서, 영국 식민통치는 기업가 등 경제 엘리트와의 결탁에 기반했고, 이런 정경유착은 선거제도에도 반영되어 지금까지 이어진다. 계급문제도 심각하여 전 세계 최고 수준 빈부격차의 구조적 재생산은 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오랜 문제이며, 홍콩 고위 공무원의 높은 연봉도 재정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고위층 약 50여 명의 연간 급여 지출이 1억 8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336억 원, 2025년 3월 환율 기준)에 달하며, 행정수반은 매달 약 47만 홍콩달러(한화 약 8천7백만 원, 2025년 3월 환율 기준)의 월급을 받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 요청에 따라 중국 국가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며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의회(입법회)에 반대파가 사라져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는 거의 없다. 지난 2년 내내 의회에서 안건 통과율은 100%였다. 고위 관원을 지낸 안소니 정(張炳良)은 홍콩의 경쟁력이던 각종 특색과 지정학적 이점이 약해졌다며, 2019년 시위 진압과 2020년 국가안전법 도입 후 중산층의 해외이민 증가, 그리고 중국의 경제 변동성 등이 홍콩의 기존 경제모델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미중 간 갈등 고조 속에서, 더 이상 중국과 다른 특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홍콩은 계속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19년 시위 기간 홍콩 시위를 ‘반중친미’로만 보는 평가가 국내외에 많았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 현상만 보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해로서, 미국에 대한 입장은 홍콩 내에도 다양하여 많은 논쟁이 이뤄져왔다.
변화의 가속화: 인구, 교육, 역사서술 변화
최근 몇 년간 홍콩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구 구성이다. 송환법반대시위와 국가안전법을 거치며 급증한 이민으로 홍콩 인구는 크게 줄었다가 현재 다시 753만 명선을 회복했지만, 인구 구성은 많이 달라졌다. 영국・호주・대만 등으로의 이주 붐은 이제 절정을 지나 추세가 완만해졌다. 해외로 나간 사람의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십만 명이 떠났고 수십만 명이 – 주로 중국 본토에서 – 들어왔다. 홍콩에는 원래 중국 본토인을 매일 150명씩 받는 쿼터가 있어서 계속 본토에서 오는 이주민이 있는 데다가, 국가안전법 이후 이민붐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시행한 고급인재 프로그램으로 온 ‘고급인재’ 중 외국인은 5%뿐이고 나머지는 중국 본토인으로, 가족까지 포함해 이 프로그램으로만 약 16만 명이 왔다. 정부는 2046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중국 본토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수반을 지냈고 중국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서 대표적 친정부파 정치인인 렁춘잉(梁振英)도, 고급인재 프로그램으로 홍콩에 와서 신분만 얻고서 바로 중국 본토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생, 교사, 경찰, 의료 등 분야마다 인력이 부족하여 자격기준을 낮추고 있고, 국가안전법 도입과 함께 홍콩에 주재하는 중국 기구의 인원은 증가했다. 홍콩에 본부를 둔 해외 기업은 줄고 중국 기업은 늘었다.
정부는 역사 새로 쓰기를 주도하는데, 정경유착(관상결탁)은 여기에도 영향을 발휘한다. 초대 홍콩 행정수반을 지낸 기업가 출신 둥젠화(董建華)가 이끄는 싱크탱크 단결홍콩기금회는 ‘홍콩지방지중심(香港地方志中心)’을 만들어 정부 입장에서 서술한 역사기록(‘香港志, Hong Kong Chronicle’)을 펴낸다. 기업가들은 홍콩의 독특한 선거제도인 직능대표제에서도 일반인에 비해 구조적으로 훨씬 큰 힘을 가질 뿐 아니라, 최근 싱크탱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홍콩의 거의 모든 전통 언론매체도 장악하고 있다. 또한 홍콩역사박물관이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홍콩 역사 관련 상설전시를 중단한 대신 설치한 국가안전전람청에는 송환법반대운동이 색깔혁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송환법반대시위 초반에 행정수반 캐리 람(林鄭月娥)은 평화롭고 질서있는 시위라고 인정했었지만, 이제 정부의 공식 규정은 색깔혁명이 되었다.
홍콩 해안방어(海防)박물관 이름에는 ‘항전’이 추가되었고(香港抗戰及海防博物館) 항전 전시실이 만들어졌다. 도서관과 서점 서가에서 내려지는 책 목록이 늘어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시진핑 사상을 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학교들에서 국민교육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날짜가 1년에 27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공산당 창립일, 중국인민해방군 건군절 등도 포함된다. 천안문 추모집회가 열리던 빅토리아공원에는 이제 집회가 금지되었고 6월 4일이면 동향(同鄕) 단체들의 화려한 행사가 열린다. 시간이 흐른 후 이곳은 동향 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기억과 역사에 남겨질지도 모른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새로운 모색
국가안전법이 홍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19년부터의 송환법반대운동이다. 1년여의 격렬한 시위를 거치며 시민들은 신체적・정신적 아픔을 겪었지만 새로운 유대, 그리고 여러 소수집단과의 새로운 연결이 생겨났다. 홍콩 정체성은 – 비록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 중국 본토와의 대립구도가 오랫동안 강력했으나, 이제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 ‘홍콩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시작되고 있다. 내부인과 외부인의 배타적 구분을 넘어서려는 노력, 그리고 도심지역 인간끼리의 연결만이 아니라 농촌과 흙과 동식물과의 연결에 대한 성찰이 생겨나고 있다. 모든 고민과 성찰은 ‘땅(土)’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2025년 초 홍콩 북부 신계지역에서 찍은 사진. 출처: 필자 제공
위 사진에서, 맞은편 육지에는 중국 선전(深圳)지역의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이쪽 홍콩 신계지역은 시골 마을을 예쁘게 꾸미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한창이다. ‘낙후한 시골 중국과 대비되는 발전된 도시 홍콩’이라는 기존 대립구도는 더 이상 홍콩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 홍콩의 특징이라고 당연시되던 많은 것이 바뀌어갈 때,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여기 남아 지키고 싶은 ‘홍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치열하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점은, 그 질문에 대해 이미 주어진 고정된 답을 찾지 않고 계속 새로운 답을 스스로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홍콩 영화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흑사회(黑社會)나 무술 관련 소재로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홍콩 영화는 이제 현실적 소재, 그리고 홍콩 역사 속 이야기 또는 평범한 이웃들의 고민을 다루며 소박하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있다. 물론 질문과 고민을 품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려는 노력은 여전히 힘겹다. 여론조사기구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정은 예전 인터뷰에서, 홍콩에 남은 것은 항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견지(堅持)’를 위해서라고 했었지만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가 농사를 짓고 촌민들과 함께 책을 만들어내지만 계속되는 재개발로 토지가 계속 수용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주민들과 함께 일상적 활동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 운동도 끊임없는 재개발로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며 중단되곤 한다. 그래도 기약 없이 계속 걸어가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한 홍콩인은 필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修行)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Tag: 홍콩, 중국,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애국주의교육, 역사쓰기
이 글과 관련된 최신 자료
-
- 장정아 (2025). “사랑이 홍콩을 구할 수 있을까: 배타적 정체성과 본질주의를 넘어서.” 『중국사회과학논총』 7(1).
- 홍콩 정부 (2025). “2025至26財政年度 政府財政預算案 (2025-26 회계연도 정부 재정 예산안).” (접속일 2025년 3월 19일). https://www.budget.gov.hk/2025/chi/index.html
- Hamlett, Tim (2024). “‘The Chilling Effect’: Where Does the Stand News Verdict Leave Opinion Writers in Hong Kong?” Hong Kong Free Press, September 15. https://hongkongfp.com
- ・Lee, Francis L.F. (2025). Pro-Democracy Contention in Hong Kong. Albany, NY: SUNY Press.
- Tse, Hans (2025). “Hong Kong Businesses Forced to Weigh Options as Trump’s Tariffs Squeeze Access to US Market.” Hong Kong Free Press, March 9. https://hongkongfp.com
- 艾迪 (2025). “圖解香港大財赤:六年五赤、入不敷支,港府為何巨額赤字?” 『端傳媒』, February 24. https://theinitium.com
저자소개
장정아 (jachang@inu.ac.kr)
현)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 『비교문화연구』(등재학술지) 편집위원장
전) 현대중국학회 부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분야 자문위원
<주요 저서와 논문>
“사랑이 홍콩을 구할 수 있을까: 배타적 정체성과 본질주의를 넘어서.” 『중국사회과학논총』 7(1), 2025.
“노동자와 향촌을 통해 보는 홍콩: 저항과 포섭의 변주곡.”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동아시아 관문도시 읽기』 (산지니, 2025 출간예정).
Embracing Peace through UNESCO World Heritage (Chang et al.),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24).
“When the Whole-nation System Meets Cultural Heritage in China.” (Liu and Chang),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30(6), 2024.
『국경 마을에서 본 국가: 중국 윈난성 접경지역 촌락의 민족지』 (공저), (인터북스,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