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아프리카 관계는 다양한 각도에서 전망될 수 있지만, 국제정세 변화와 글로벌 사우스 부상이라는 거시적 맥락을 토대로 양 대륙 간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경제협력, 디지털 중심의 기술협력, 기후환경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안보협력 및 외교적 연대 가능성에 집중하여 양 대륙의 복합적인 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2025 전망: 아시아-아프리카 관계를 중심으로

출처: Flickr / 작가: Focal Foto (https://flic.kr/p/2omr4Rj)
2025년 1월 재집권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당시 아프리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기록이 전무하고, 2018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방문 및 동년 ‘미국-아프리카경제포럼’에 고위급 정상회담이 아닌 비즈니스 협력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2기에도 아프리카와 협력 수준을 정상급 회담으로 제고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공격적으로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을 2025년에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바이든 행정부가 도모한 미·중 전략경쟁과 인·태전략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쇠퇴하고 아시아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미국 중심의 아프리카 전략보다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글로벌 사우스 연대가 미국과 G7보다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국제정세를 토대로 2025년 아시아-아프리카 관계는 다양한 각도에서 전망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경제협력, 디지털 중심의 기술협력, 기후환경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안보협력 및 외교적 연대 가능성에 집중하여 양 대륙의 복합적인 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 경제협력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해 빠르게 경제성장하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욱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대륙은 12억 이상의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이내 아프리카의 15~65세에 해당하는 생산 인구가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출범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의 경우, <어젠다 2063>을 주창한 AU가 주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통합 프로젝트로서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이 예상된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한국과 AfCFTA 간 무역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중국,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이 아프리카의 에너지, 광업, 농업 분야에 해외직접투자(FDI)를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연자원과 농업 중심의 경제를 보유한 아프리카와 성장세의 제조업과 기술 산업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중국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해 아프리카와 인프라 협력에 지속적인 강구하고 일본과 인도는 기술 및 제조업 분야에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기술협력
한국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양대 축 중 하나가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한국은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플랫폼, 핀테크 분야에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5년에도 아프리카와의 디지털 분야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모바일 기술과 인터넷 연결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와 핀테크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아시아의 핀테크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알리페이와 인도의 핀카르 등의 아시아 기업이 공격적으로 아프리카의 전자결제 시장을 겨냥해서 진출하고, 아프리카는 아시아의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기후환경협력
기후변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로, 2025년에도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가뭄, 홍수 등의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후환경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과 인도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남남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프리카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물 관리, 산림 보호 등 환경 분야에서 협력하여 기후환경과 농업개발이 연계되는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2025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 정치안보협력
2024년과 유사하게 2025년에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탄자니아, 토고, 나이지리아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에티오피아, 모리셔스, 가나에서 예정된 총선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선거는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슈와 변수를 동반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정치적 변화도 다층적일 것이다. 여러 국가들에서 민주적 전환과 정권 교체가 예상되며, 민주화가 진행되는 국가들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국가들이 공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테러리즘과 내전 등 안보 문제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며, 특히 사헬 지역과 동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무장 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25년에도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관한 아시아와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영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UN의 평화유지활동(PKO)은 지속될 것이나, 중국과 인도는 국내정치 비간섭주의를 강조하며 아프리카 정치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아프리카의 민주화 및 인권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반면, UN의 PKO 및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도양을 경유하는 해상 무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하여 해적 문제와 해상 무역로 보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2025년 아시아-아프리카 협력관계는 경제성장, 정치적 변화, 기후환경, 디지털 격차, 그리고 안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 대륙 간의 협력에 관한 전망은 아시아 주요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라는 거시적이면서도 경쟁적인 프레임을 토대로 정치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시아의 개발모델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이른바 ‘아시아의 함정(Asian trap)’의 위험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회귀,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공격적인 글로벌 사우스 끌어안기 현상이 아프리카 대륙의 진정한 목소리를 외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도 전략적으로 미국과 중국 및 인도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 파트너 관계가 아닌 정치화된 이해관계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양태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도의 노력과는 별개로 다른 역내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 미국과 인도 사이에서의 실용외교를 통해 인도를 향한 압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네팔과 몰디브에 친중파 인사들이 집권했다는 사실과 방글라데쉬에서 반인도 지향의 세력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인도의 일방주의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복잡다단한 다차원 방정식에 대해 인도는 매번 해답이 드러나고 나서야 자신들이 애초에 알던 답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믿는 척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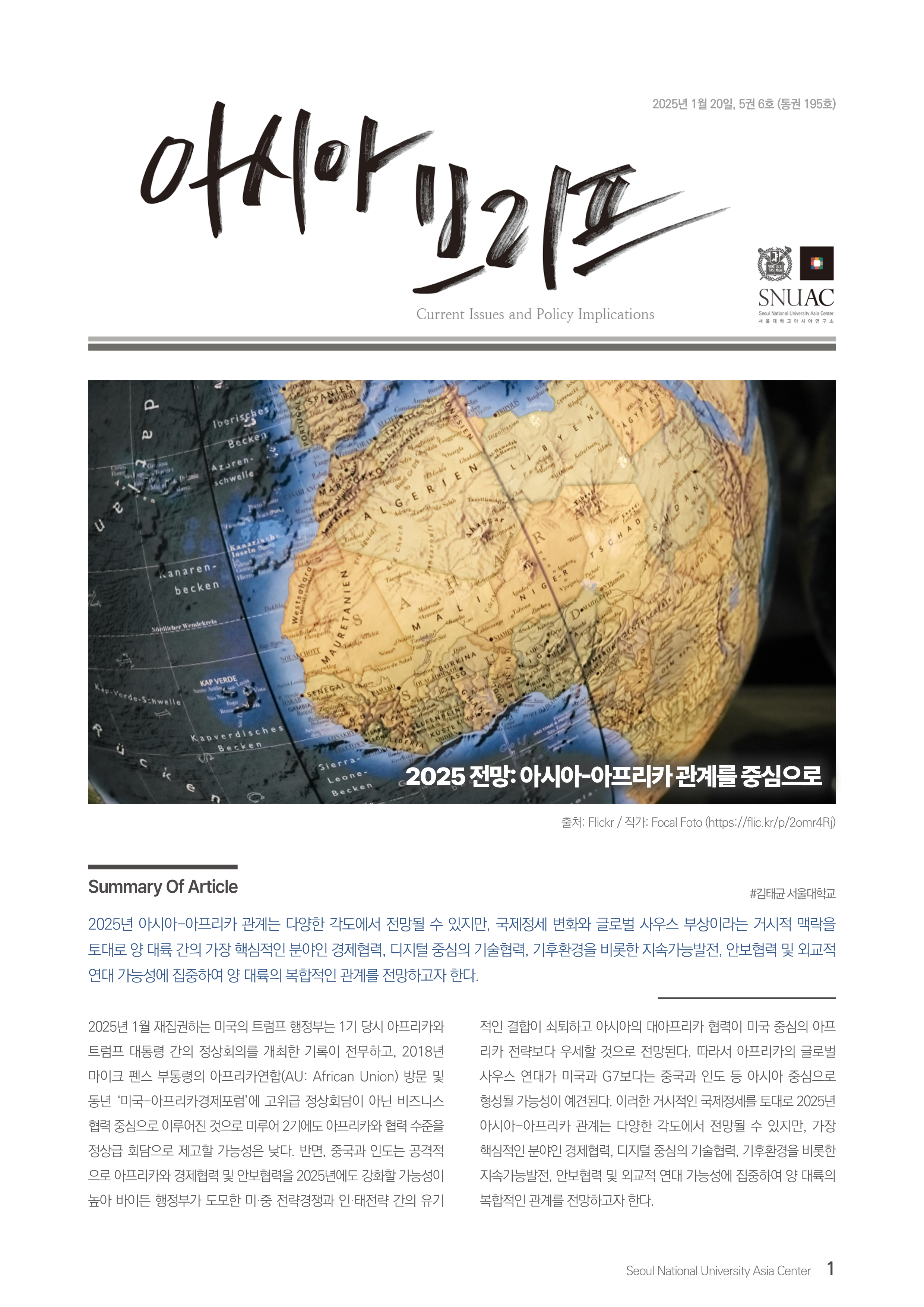
Tag: 아프리카, 아시아, 경제협력, 기술협력, 기후환경협력, 정치안보협력
이 글과 관련된 최신 자료
-
- 김태균 (2023). 『반둥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진인진.
- Adem, Seifudein and Darryl C. Thomas (2018). “From Bandung to BRICS: Afro-Asian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Pedro Amakasu Raposo, David Arase, Scarlett Cornelissen, eds. Routledge Handbook of Africa-Asia Relations. Routledge.
- Jain, Amit and Landry Signé (2024). “New trends in Africa-Asia economic relations.” Brookings Commentary, 29 May. https://www.brookings.edu/
저자소개
김태균 (oxonian07@snu.ac.kr)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단장, 서울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센터장
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한국국제협력단 민간 비상임이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와 논문>
주요 저서와 논문
『반둥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진인진, 2023).
Asianization of Asia (Abingdon: Routledge, 2024). (공편)
“Riding on the Interregnum: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for the New Standard of Civilization.”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3), 2025.
“Navigating South Korea’s Development Studies: A Compressed Trans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37, 2025.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