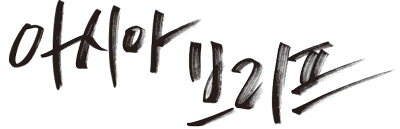올림픽은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경기들의 총합이지만 동시에 경기장 밖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정치적 행위다. 올림픽은 강대국의 선전장이자 신생 독립국의 문화통치였으며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 전략이었다. 21세기 들어 올림픽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올림픽에 의해 도시개발, 환경파괴, 사회적 긴장 등이 고조되자 ‘지속가능한 올림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곧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복잡한 상황을 들여다본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
- 02-880-2087
- snuac.issuebrief@gmail.com
파리 올림픽 ‘인류의 제전’ 이면에 국가주의와 개발주의


<그림> 파리 올림픽, ‘Games Wide Open’ 출처: linkedin.com
‘Games Wide Open’
파리 현지 시각으로 7월 14일 일요일, 자유 평등 연대의 프랑스 대혁명을 기리는 프랑스 최대 국경일(Fête National), 즉 ‘바스티유 데이’에 맞춰 2024 파리올림픽 성화가 파리 전역을 순회하였다. 프랑스 축구의 레전드이자 현 프랑스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인 티에리 앙리(Thierry Henry)가 상젤리제에서 출발했고 이후 성화는 여러 사람을 거쳐 개선문, 그랑 팔레, 뤽상부르 공원을 돌아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어졌다. 그곳에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진(본명 김석진)이 있었다. 수백 명의 ‘아미’(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들은 아침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르 피가로’에 따르면 일부 팬들은 ‘성화보다는 진’이 목표였다. 이윽고 진이 성화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일단 루브르가 개막식 열리기 전까지는 종점이었기 때문에 뛸 이유는 없었다. 진이 걷자 아미들도 걸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리고 파리는 자국의 올림픽을 세계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설계한 것이다. 슬로건 자체가 ‘Games Wide Open’이다. 여기서 ‘오픈’은 시설물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존과 연대를 뜻한다.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전설이자 축구를 통해 평화를 외치는 디디에 드로그바(Didier Drogba)가 성화 봉송의 일원이 된 것이 그런 까닭이다. 가난과 내전의 나라에서 태어나 5살 때 프랑스로 건너온 드로그바 선수처럼 지금 파리에는 다양한 이주 경로를 가진 수많은 ‘비프랑스계 프랑스인’들이 살아간다. 파리올림픽의 ‘경기 외적인 요소’를 전담하고 있는 안 이달고(Anne Hidalgo) 현 파리 시장 역시 스페인 출생으로 2살 때 프랑스 리옹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성화 봉송의 스펙터클 문화 정치
다시 성화를 주목해보자.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주최국의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성화는 올림픽이 ‘국가 정체성의 문화적 의례’임을 잘 보여준다. 1896년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릴 때부터 경기장에 불을 밝히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주최국의 전국 주요 도시로 국가 의례화한 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다.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Albert Speer)의 웅장한 국가주의 경기장과 조각가 아르노 브레커(Arno Breker)의 강력한 인종주의적 조각들로 빚어진 베를린 올림픽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스펙터클 문화통치’로 충분한데 나치 당국은 성화를 독일 전역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나치와 히틀러에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베를린과 구 프로이센 이외 지역을 ‘하나의 독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의 현대 스포츠 정책을 주도했으며 1936베를린올림픽의 총괄한 칼 디엠(Carl Diem)의 프로젝트였다. 그는 고전 그리스 시대 이후 유럽 문명과 정신사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성화’가 가진 신화적이며 정치적인 의미를 수많은 문헌과 전설과 담론으로 꿰뚫고 있었다.
그는, 성화를 희생과 헌신과 불멸의 전형적인 독일적 영웅 서사로 빚어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이자 프랑스 민족주의자이며 올림픽을 통한 남성적 유럽 중심주의의 설계자인 피에르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은 베를린 올림픽 폐막식에서 “빛과 따뜻함을 주기 위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가져온 태양으로 달궈진 불을 기억하라”고 연설했다. 또한 올림픽이 끝난 후 자국의 <르 주르날(Le Journal)>에 “베를린 올림픽의 성공으로 올림픽의 이념은 더 숭고해졌다”고 썼다. 보불 전쟁 이후 피폐해진 프랑스의 민심과 만국박람회 이후 다시 부흥하는 프랑스의 민족주의를 올림픽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또 유럽 전역으로 확산한 쿠베르탱의 확고한 유럽 중심적 신념을 엿볼 수 있다.
그로부터 성화는, 그리고 올림픽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3요소, 즉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문화적 수단으로 강력하게 접합시키는 스펙터클 문화통치로 작동하였다. 대표적으로 1964년 도쿄올림픽이 있다. 그때 성화는 오키나와에서 출발했다. 일제의 강점과 2차 대전 막바지의 처절한 전투 그리고 미군 점령지가 된 오키나와는 그 무렵 독립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성화의 첫 출발지가 됨으로써 적어도 그 순간 올림픽을 시청하는 세계인들에게 오키나와는 완전한 일본의 영토로 각인되었다.
그 성화는 일본 열도를 돌아 도쿄 올림픽주경기장으로 들어섰는데 마지막 성화주자는 어렸을 때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청년이었다. 그가 마지막 성화 점화를 함으로써 일본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전범 국가가 아니라 단지 패전 국가였을 뿐이며 과거에 얻어터졌지만 이제는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었다.
‘자유와 예술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전범국 일본 못지않게 정교하다. 그들의 성화는 본토 프랑스와 해외 영토를 순례했다. 베르사유 궁전이나 몽 생 미셸 성당 같은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1차 대전의 베르됭 기념관과 2차 대전의 디데이 랜딩 비치(노르망디) 같은 전쟁의 장소를 거쳤으며 무엇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횡단하여 과들루프, 프랑스령 기아나,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레위니옹 등 프랑스의 5개 해외 ‘영토’까지 돌았다. 올림픽 역사상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최장 거리 성화 봉송이다.
폴 고갱(Paul Gauguin)의 마지막 거처로 잘 알려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의 타히티에서는 올림픽 서핑 종목이 열린다. 올림픽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의지가 거의 과거 제국 시절 프랑스의 영토와 영광을 회복하듯이 진행되는 것이다. 파리에서 약 9,700마일, 비행기로 21시간 거리다. 역사상 최장 거리 개최국이다.
‘본토’에 서핑 해변이 없는 게 아니다. 지리·정치학적 관점의 결정이다. 경기 운영과 심판을 위해 알루미늄 타워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전 세계 산호초가 유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위와 파리시 당국이 천명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올림픽’을 무색케 한다. 물론 주도자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 조립식 기구로 설치하여 대회를 마친 후 철거한다는 식이다.
이런 대응 중의 하나가 프랑스의 대표 요리인 푸아그라(Foie gras)다. ‘르 몽드’(Le Monde) 7월 1일 자 기사에 따르면 조직위는 동물 복지 존중 차원에서 수많은 문화행사의 식단을 조절하였으나 세계 정·재계와 스포츠계 거물들이 참석하는 만찬에는 푸아그라(거위나 오리의 간을 재료로 사용)는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요리지만 식용 사육의 잔인함을 대표하는 푸아그라는 어쩔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만찬 케이터링 메뉴에서 제외하라는 거센 비판과 청원을 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아마도 조직위는 적절한 타협을 취할 것이고 글로벌 VIP들은 공개적으로 점잖게 사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지도 모른다. 인류를 위한 에티튜드로써 말이다.
이보다 더 격렬한 문제는 현실 정치에 있다. 지난 5월 중순,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는 유권자 확대 개정안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고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서 말한 ‘본토’ 이외 지역 해외 프랑스령의 성화 봉송 행렬에서 누벨칼레도니가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여전히 제국이고 국민 정체성의 정치적이며 제도적인 실천 과정인 선거법을 통해 여전히 지구 반대편의 일부를 제압하고 있다.
이런 중에 올림픽이 열린다. 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즉 마지막으로 누가 성화를 점화할 것인가는 극비 사항이므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를테면 알제리계 출신으로 프랑스의 똘레랑스를 상징하는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Zinédine Zidane) 같은 사람이 마지막 불꽃을 점화하게 된다면 적어도 시각 연출의 차원에서 파리올림픽의 문화정치는 정점을 찍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제국이 아니라 똘레랑스의 나라라는 국제적인 알리바이를 전개할 것이다.
불안한 정세와 올림픽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안 이달고 시장이 센 강에 뛰어들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파리의 젖줄 센 강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의 야외 개막식이 5km에 걸쳐 치러지고 철인3종경기 수영 종목과 수많은 문화 행사가 열리는데 수질 오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CNN의 7월 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달고 시장은 수질 오염 문제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개막식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수영하겠다고 장담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센 강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즉 극우파의 득세에 따른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지휘하느라 후순위로 밀렸다. 어쨌든 현역 선수들보다 대통령이나 파리 시장이 센 강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아 보인다.
그들에게 센 강 수영은 수질 개선이나 올림픽 안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종종 얼음물에 뛰어들거나 유도복을 입고 경호원을 업어치기 하듯이 마크롱도 이두박근이 불뚝 솟은 복싱 사진을 공개하거나 디디에 데샹(Didier Deschamps) 전 프랑스 축구 대표팀 감독 등과 자선 축구 대회에 참여하여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전파했다. 권력자들이 여가 시간에 체력 단련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강한 면모를 통해 자국의 강력한 위력을 보이기 위한 설정샷들이다.
다행히 중도좌파 연합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지난 두 달 동안 프랑스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마리엔 르펜(Marine Le Pen)이 이끄는 극우파 국민연합(RN)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힘을 과시했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국의 정치 지형 또한 극우파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 뻔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마크롱은 센 강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했고, 바로 그 마크롱의 기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안 이달고 시장도 개막식 전에는 반드시 수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나치의 탄압을 피해 서방으로 망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가 ‘비정치적인 스포츠는 없다’고 백여 년 전에 말한 것이 지금도 재연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좀 더 현실 정치의 내부로 들어가 보자.
7월 7일 조기 총선이 임박했을 때 마크롱과 이달고의 고민은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그 하나는 극우파의 득세에 따른 정치적 혼돈이며 다른 하나는 그 여파로 인한 올림픽 분위기의 침체다. ‘다행히’ 극우파의 쇄도는 유럽의회에 진출하는 정도로 멈췄으며 중도파와 좌파가 연합한 ‘신인민전선'(NFP)으로 급한 불은 껐다. 그렇다면 올림픽 분위기는?
총선 직전 이달고 시장은 파리는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림픽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조르당 바르델라(Jordan Bardella, 극우파 국민연합의 29세 신예 정치인) 대표와 함께 서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좌파 연합이 극우파 국민연합(RN)을 눌렀다. 이로써 프랑스의 정치적 돌풍은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올림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가.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조밀하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엉성하다.
유럽의 이민자 사회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튀르키예 국영 통신 ‘아나둘루’(Anadolu Ajansı)가 1월 초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 건설 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적절한 사회보장이나 휴식일 없이 하루에 약 80유로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계약서에 보장된 월급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나 동유럽 출신의 노동자들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파리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방리유(파리 외곽 빈민가)를 전전해야 한다. 취재에 응한 세네갈 이주 노동자는 “존중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수년째 파리의 해결 불가능한 사태로 보이는 이 문제가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더 고조되었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의 토니 에스탕게(Tony Estanguet) 위원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에 따라 올림픽 분위기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일단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총선 상황에서도 올림픽 관계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공공 서비스에 의하여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그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대대적인 파업이 예고되었다.
7월 8일 자 ‘르 몽드’에 따르면 파리 공항노조가 올림픽 보너스 균등 지급 건으로 올림픽 일주일 전에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여름휴가 기간인 ‘7말 8초’에 올림픽이 열리고 이에 따라 공항 업무까지 가중되는 상황인데 추가 보너스나 인적 지원이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파리 관광의 1번지이자 현대예술의 집약체인 퐁피두센터 역시 올림픽 기간 가중되는 노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 산정에 이의를 두고 파업을 예고했으며 극단적인 경우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사실은 총선 결과와 무관하며 이전부터 누적된 프랑스 사회의 숙제다.
영국의 저명한 스포츠 연구자로 『The Games: A Global History of the Olympic』의 저자이자 국내에는 <축구의 세계사>가 소개된 데이비드 골드블라트(David Goldblatt)는 2023년 10월 19일 자 ‘ CNN Opinion’ 기고문에서 올림픽이란 인류의 제전이라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합법화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활용하는 스펙터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베를린이 1936년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비독일계 낙인자들을 시 외곽 수용소로 이송한 점, 1964년 도쿄 올림픽 직전에 경찰이 수백 명의 노숙자들을 도시 외곽으로 이동시킨 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대 이른바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을 모스크바에서 청소하겠다고 천명한 점, 1984년 LA 올림픽 때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경기장 주변의 흑인 및 라틴계 청소년과 노숙자들을 공격적으로 소탕한 점,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2009년과 2016년 사이에 무려 7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시 외곽으로 쫓아냈으며 그들에게 최소의 보상과 열악한 공용 주택을 제공한 점 등을 거론한 후, 2024 파리 역시 새로운 미디어 센터 건립을 위해 도심의 숲을 벌채하려고 시도하거나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도심의 지나친 통제와 파리 외곽(방리유)의 강압적 조치가 예고된다고 썼다.
물론 1952년 헬싱키의 사회 주택 프로젝트나 2012년 런던의 서민용 올림픽 타운 같은 모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1968년 멕시코 대 주거용 타워는 중산층 공무원 할당이나 1992년 바르셀로나 때 신축한 올림픽 선수촌이 고풍스러운 바르셀로나 해변을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급등의 진원지가 되는 등 역대의 올림픽은 그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악화시켜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적인 역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썼다.
IOC의 결단과 파리의 실천
냉정하게 말하면 IOC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IOC는, 골드블라트가 예시하고 비판한 올림픽의 사회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20세기의 올림픽과 결별하려고 노력해왔다. 20세기의 올림픽은 밖으로는 국가주의요 안으로는 개발주의다. 강대국은 그들 나름대로 강력한 국가주의를 화려한 개막식과 올림픽 상위 점령으로 과시했다. 약소국들은 올림픽을 통하여 저마다의 국위선양을 기치로 내걸었다. 우리의 경우 1988년 슬로건이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였다. 그리고 골드블라트의 예시대로 동서를 막론하고 올림픽은 주최 도시의 획기적인 개발 프로젝트의 명분이자 목표였다. 골드블라트가 깜빡했지만, 우리의 경우 1988 서울올림픽은 상계동 철거와 강남 개발의 화룡점정이었다. 냉전 시대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릴 때는 미국과 그 연관국들이 불참했고 LA에서 열릴 때는 구소련과 그 연관국들이 불참했다. 올림픽이 ‘비정치적’이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올림픽이 국민 동원 권력체제의 도구가 되고 환경 파괴와 도시 불평등을 야기하자 IOC는 수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올림픽 어젠다 2020’을 천명했다. 분쟁, 재난, 환경, 생태, 혐오, 차별 등 인류의 중대한 문제를 올림픽을 통해 완화하거나 최소한 올림픽 자체가 이를 생산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시도다. 2023년 10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141차 총회에서는 인권 가치 실현을 핵심으로 하여 올림픽헌장을 개정한 점이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협력 기구로 활동하기 시작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점에 파리가 개최도시로 선정되었다. 2017년 9월 파리가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 프랑스 정부는 ‘연대, 탁월, 우정, 존중’이라는 가치를 천명했다. 그 가치는 세부적으로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생태적 책임’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의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숙제다. 이를 적어도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만큼이라도 실현하겠다는 것이 IOC와 파리조직위의 의지다.
예컨대 탄소 배출의 경우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340만 톤,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360만 톤이 배출되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탄소 제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활용 시설의 95%가 기존 시설이나 임시 시설이며 경기장의 80%가 반경 10㎞ 이내에 밀집하도록 구성하여 1만 대의 자전거로 충분히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그 일환이다.
아울러 IOC와 ILO(국제노동기구)와 협의하여 ‘2024 사회 헌장, 더 비기닝’ 프로젝트를 작동하는바 불법 노동, 반경쟁적 관행, 고용에서의 차별 등을 해결하거나 올림픽 관련 건설 지역 고용 및 지역 사회 개발 촉진 등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부족한 점이 확연하기는 해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진일보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올림픽을 치른 뒤에는 그 도시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황폐화(강원도 평창, 정선 일대의 올림픽 시설들을 보라)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구현하려는 IOC와 그 첫 실험대에 오른 파리의 노력은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와 사회, 스포츠와 도시의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니 걸핏하면 러시아의 푸틴을 들먹이거나 극우파의 정치 혼란을 거론하는 마크롱은 IOC나 이달고 시장에 비하면 노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월 5일 자 BBC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은 ”러시아가 파리 올림픽을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무렵이나 그 이후, 그의 발언을 확증할 만한 증거나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 푸틴이나 마크롱이 서로 말로 주고받는 공포탄만 난사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프랑스의 내부 문제 그리고 파리의 도시 문제다. 브리스톨대학교 출판부의 ‘사회전환연구소’(transforming society)에 따르면 ”스포츠 스펙터클을 취재하기 위한 글로벌 미디어의 밝은 빛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올림픽 개최도시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추방“한다. 연구소는, 우리의 1988 서울올림픽에 대해 ”남한을 통치하는 군사 독재 정권이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를 잔인하게 ‘미화’시키는 과정에서 무려 72만 명의 사람들이 쫓겨났다. 이 극심한 황폐화에 따라 인근 지역 전체가 피폐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한 일이 지금 파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판단이다. “올림픽은 영리와 스펙터클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된 구성원들을 학대할 수 있는 편리한 알리바이를 제공”하기 마련이라는 연구소의 경고를 마크롱과 이달고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올림픽은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남녀 성비가 50 대 50으로 균형을 이룬 점,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을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며 공존하는 차원으로 준비한 점, 선수와 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시도 자체를 억제하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번 올림픽이 이전의 국가주의 올림픽(심지어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하여 무관중이었다)에서 바람직한 인류 공동체의 공존과 진보를 향해 진일보할 것이다.
‘본토 프랑스’에 한정된 알리바이일지라도, 어쨌든 프랑스는 자유, 평등, 연대의 나라이며 파리 또한 인구 구성 자체가 ‘똘레랑스’가 아니면 하루도 운영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으니 진실로 ‘Games Wide Open’의 올림픽이 되어야만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Tag: 올림픽,문화정치,지속가능성,도시개발,국가주의
이 글과 관련된 최신 자료
- 박해남 (2023).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의 정치학.” 『아시아브리프』 3(1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snuac.snu.ac.kr/
- David Goldblatt (2023), “Paris continues a shameful Olympic tradition.” CNN opnion, 2023, 10, 19. https://edition.cnn.com/
- Krieger, Jörg (2023). “Better, Bigger, Bitter: The Rise of the Asian Games in a Toxic Political Environment.” Sports Mega-Events in Asia. Springer. 123-141.
- Matti, J., & Zhou, Y. (2022). “United we feel stronger? On the Olympics and political ideology.” Economics of Governance 23(3), 271-300.
저자소개
정윤수(prague@skhu.ac.kr)
현)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경기도 인권위원
전)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 경기문화재단 이사
주요 저서와 논문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공저), (나녹, 2017).
“스포츠와 응원가 : 강렬한 정념의 집합적 표출.” 『대중음악』 31, 2023.
“예술인 지원정책의 전환과 참여소득의 가능성.” 『대중음악』 29, 2022.
“1990년대 피씨통신과 취향공동체의 형성.” 『사회와 역사』 127, 2020.